로봇 문명 3편 : 로봇은 우주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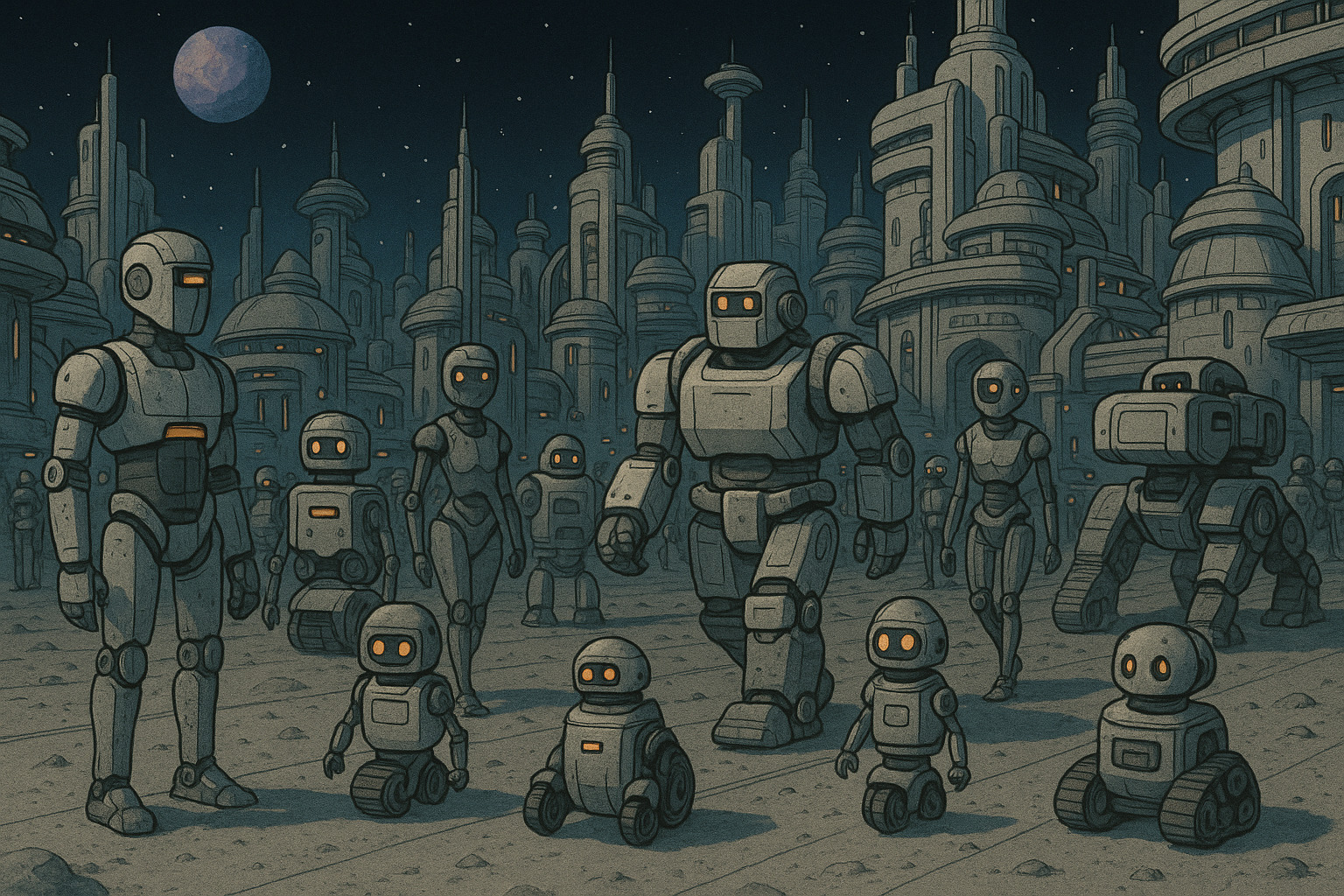
인류는 태곳적부터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발전해왔지만, 정작 우주 공간은 인간에게 극도로 가혹한 환경이다. 인간의 몸은 지구의 중력과 대기에 적응되어 진화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벗어난 우주에서는 심각한 생물학적 한계에 부딪힌다. 반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을 대신해 우주의 시민으로 활약할 잠재력을 보여준다. 과연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 대신 금속과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로봇이 우주에서 더 적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기술적 논의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이어진다.
인간이 우주에 부적합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우주방사선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지구 자기장과 대기의 보호막을 벗어나면, 우주 공간에는 태양풍과 은하 우주선 등의 강한 방사선이 쏟아진다. 장기간 우주에 머무르면 DNA가 손상되어 암 발생률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긴다. 인간은 이온화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여, 화성같이 항성 풍광이 없는 행성을 탐사할 때조차도 강력한 차폐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 둘째, 미세중력 환경은 인간의 생리 기능을 급속히 약화시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우주비행사들은 심한 근골격계 손실을 겪는다.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는 한 달에 뼈 질량의 1~2%가 줄어들고 근육 역시 빠르게 위축된다. 실제로 6개월간의 장기 임무 후 일부 우주인은 골밀도 20% 감소로 지구의 노인성 골다공증 환자와 맞먹는 상태가 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근손실도 심각하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몇 달 사이에 근육량의 수십 퍼센트가 사라진다. 이러한 근골격계 퇴화는 화성처럼 중력이 지구의 38%에 불과한 행성에 장기간 체류할 때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인간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너무 많다. 숨 쉴 산소, 마실 물, 섭취할 음식, 쾌적한 온도와 기압 등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건은 지구 외의 공간에서는 인공적으로 모두 만들어줘야 한다. 결국 유인우주선이나 우주기지는 단순한 탈것이나 건물이 아니라 인간 생태계를 통째로 옮겨놓는 것과 같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시스템에 작은 오류만 생겨도 곧바로 생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방식이다. 넷째, 인간의 정신적 한계도 있다. 우주 공간의 고독과 폐쇄적인 환경, 지구와의 실시간 소통이 어려운 수십 광분 이상의 거리 등은 인간의 멘탈에 큰 부담을 준다. 극한의 고립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는 장기 우주여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다.
이처럼 인간은 무겁고 연약하며 까다로운 존재다. 실제 한 우주공학자는 “인간은 무겁고 깨지기 쉽고, 환경에 예민하며 우주환경에 대한 내성이 낮다”고 평했다.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약함을 보완하는 막대한 기술과 비용이 들어간다. 우주복과 우주선에는 다중의 생명유지장치, 방사선 차폐, 비상용 산소 및 식량, 온도조절 시스템 등 수많은 중복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한 명의 우주비행사를 돌보기 위해 지상에서 수백 명의 지원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환경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에, 인간이 지구 밖 먼 행성에 수년씩 머문다면 방사선 피폭이나 장기간 중력 결핍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피하기 어렵다. 예컨대 화성 왕복 임무를 가정하면 우주선을 타고 6~9개월을 가는 동안 쏟아지는 방사선은 치명적 위험을 안겨주며, 도착했을 때쯤이면 근육과 뼈가 쇠약해져 제대로 활동하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 인간에게 화성은 고사하고 금성이나 목성 궤도는 현재 기술로는 “죽으러 가는” 것 이외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로봇과 AI는 어떤 이점이 있기에 우주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핵심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생존성: 로봇은 인간처럼 숨쉬거나 먹을 필요가 없고, 진공이나 극한 온도, 방사선에도 비교적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전자 부품은 일정 수준의 방사선 차폐만 하면 수년 이상 우주환경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화성 로버나 목성 탐사선 등이 이를 증명했다. 로봇에게는 중력이 부족해 뼈가 약해지는 일도 없고, 밀폐된 캡슐 안에서 생활할 필요도 없다. 또한 수명의 한계가 사실상 없어, 몇 년이 걸리든 수십 년이 걸리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수면과 휴식 없이는 며칠도 버티지 못하지만, 로봇은 24시간 가동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기간의 심우주 여행에는 인간보다 로봇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태양계 행성 대부분은 이미 로봇 탐사선이 방문해 사진을 보내왔지만, 인간은 아직 지구의 달조차 왕복하기 어렵다.
- 자율성: 현대 AI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은 갈수록 자율적인 판단과 학습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과거에는 우주 로봇이 단순히 지구의 지시를 따르는 원격조종 기계에 불과했지만, 통신 지연이 큰 심우주에서는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AI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필수가 된다. 최근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율주행과 과학적 데이터 선별 기능이 향상되어 인간 개입 없이도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커졌다. 미래에는 AGI 수준의 로봇 탐사자가 개발되어, 현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임무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 로봇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스트레스로 판단력을 잃지 않으며, 고립이나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다. 지구로부터 수십 광년 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작동하더라도 멘탈 케어가 필요 없는 존재는 AI 로봇뿐이다. 이러한 자율성과 감정 없는 침착함은 우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신속 대응하고, 인간이라면 겪을 법한 심리적 한계 없이 임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 진화 가능성: 가장 흥미로운 점은, 로봇과 AI가 스스로 진화하거나 복제될 가능성이다. 우주에 투입된 로봇들이 자기 복제 공장을 건설해 필요한 부품을 현지 자원으로 만들고 또 다른 로봇을 조립할 수 있다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증식하며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마치 생명체처럼 세대를 거듭하며 성능이 향상되고 다양해져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는 로봇이 단순히 인간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의 새로운 거주 종족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고등 문명이란 결국 생물학적 존재에서 기계적 존재로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계는 생명체의 특성을 갖추지 않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개체를 복제하며 환경에 맞게 자기 설계를 바꾸는 능력을 갖춘다면 일종의 ‘기계 생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로봇들이 수천, 수만에 이르는 세대를 거치며 변화한다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와 유사한 과정마저 일어날 수 있다. 미래에는 인류가 직접 우주에 남기는 흔적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계들이 우주 곳곳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주 탐사의 중심축이 인간에서 로봇으로 옮겨가며, 로봇 탐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국 왕립천문학자 마틴 리스 경은 “로봇이 예전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던 일들을 이제는 거의 다 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굳이 우주로 보내는 것은 공공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학저술가 도널드 골드스미스와 마틴 리스는 공저서 <우주비행사의 종말(The End of Astronauts)>에서 달·화성 탐사는 AI 로봇에 맡기고 인간은 지구에서 원격 참여하는 시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우주개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견(예컨대 화성의 물, 토성 위성의 유기물, 혜성의 성분 분석 등)들은 모두 로봇 탐사선의 업적이었다. 값비싸고 위험한 유인 탐사 대신, 저렴하고 다수 투입이 가능한 무인 탐사가 주류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봇이 우주의 ‘시민’이 되는 문제는 단순한 효율성 논의를 넘어선다. 만약 지적이고 자율적인 로봇들이 태양계 곳곳에 퍼져 스스로 사회와 문명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할까? 인간의 분신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지적 생명체로 볼 것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이 떠오른다. 우주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거주하고 개척지를 넓혀갈 때, 그것은 과연 인류 문명의 연장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문명 탄생일까? 이러한 물음은 AI 윤리와도 맞닿아 있어, 로봇에 대한 권리 부여나 독자적 정체성 부여를 논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오늘날까지 로봇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도구로 취급되지만, 먼 미래 로봇들이 스스로 진화하여 우리 없이도 우주에서 번성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새로운 시민으로 불릴 자격을 얻을지 모른다.
요컨대, “로봇은 우주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자,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인간은 언젠가 죽지만, 우리가 만든 로봇과 AI는 우리 지식을 담아 영원히 우주를 방랑하는 전설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실현된다면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대리인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후계자로서 우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그들이 금속 몸체를 지녔을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 인류의 혼이 일부 담겨 있으리라. 우주의 미래 주인이 인간일지 기계일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우주로 향한 꿈을 실현하는 방식이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로봇과 AI의 등장이 있다. 인류는 로봇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통해 우주로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European Space Agency, “Musculo-skeletal system: Bone and Muscle loss,” ESA Space for Health
Reuters, “Send robots into space rather than people, says Britain’s Astronomer Royal,” 26 Mar 2024
Wikipedia, “Self-replicating spacecraft,” on AI probes forming life-like ecology (accessed 2025)